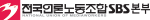지난 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SBS를 빼앗겼다”고 짐짓 분에 겨운 듯 막말을 늘어놨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던 이 전 대통령은 “그것도 적폐”라고 맞장구를 쳤고 홍 대표는 한 술 더 떠 “강도짓”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방송장악을 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권력을 지탱하기 힘들었던 부패 권력의 핵심다운 발언으로 언론자유를 유린했던 과거에 대한 자기고백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5월 대선 과정에서는 “SBS 뉴스를 없애버리겠다”는 극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더니, 7개월 뒤 SBS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랬다면 유감”이라며 위기를 모면하느라 진땀을 빼던 홍준표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에는 별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홍 대표가 SBS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의 현장에서 있던 한 사람에 대해선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금열. SBS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지내며 지상파 방송 SBS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다가 한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대통령실장으로 변신한 대표적 폴리널리스트다. 청와대에서처럼 이날도 이 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던 그는 홍준표 대표의 SBS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자리를 떠나 애써 막말의 순간을 외면했다. 한 때 SBS의 대표였던 자로, 단 한 마디 항의나 정정도 하지 않았다. 사내 일각에서는 ‘사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실망과 탄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그 사람다운 반응이다.
하금열 사장 시절, SBS 구성원들은 종편 탄생의 길을 열어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킨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거센 투쟁을 벌였다. 당시 하 사장을 비롯, 훗날 이명박의 입으로 변신한 최금락 당시 보도국장 등은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후배들의 투쟁에 직접 징계 기사를 작성해 방송하며, 배신의 칼날을 꽂았다. 그들의 통제 아래 SBS 보도는 4대강과 자원외교 등 껍데기만 화려했던 국책사업을 홍보하는 권력의 입 노릇을 하며 신뢰 추락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이 손짓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SBS를 떠났다. 그들에게 SBS는 한낱 출세의 수단이자, 권력 접근의 통로에 불과했다. 그들이 SBS를 단 한 순간이라도 책임 있는 언론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나 싶다. SBS를 능멸하는 이들의 옆에서 카메라 피하기에 급급했던 하금열 전 사장의 뒷모습은 과거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SBS를 등졌던 그 때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기사와 앵커 클로징 멘트로 홍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SBS는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들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으니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들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래 줄줄이 권력의 나팔수로 변신한 SBS 출신 폴리널리스트들이 새겨 놓은 주홍글씨와 우리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포기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들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런 기억에 기반해 대중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홍준표야 그렇다 치고, 너희 SBS도 그렇게 오해할 만하지 않느냐’고. ‘그것이 그냥 오해였냐’고.
최근 과거 위안부 합의 보도 등에 대한 자기 반성을 담은 보도와 앵커멘트, 그리고 ‘홍준표 막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SBS 뉴스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SBS의 이마에 새겨진 주홍글씨와 부끄러운 기억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소환돼 우리를 짓누를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과거와의 단절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임 보도본부장의 취임 이후 본부장실에서는 권력에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헌납했던 문제적 보도책임자들의 사진이 말끔히 치워졌다. 우리 보도도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깨끗하게 ‘단절’을 선언하기 바란다. 이는 신뢰 회복과 혁신의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