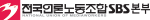제6회 성평등언론실천상 수상작 인터뷰⓵ 김혜리의 필름클럽(최다은)
“같은 여성이라도 자기가 겪어온 세월이나 경험이 다르면 그 관점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좀 불편하지만 더 끄집어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4부작 영국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0대 청소년이 남성 중심의 SNS를 어떻게 소비해 극단적인 젠더혐오까지 일으키는 지를 영국의 평범한 가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줬다.
최다은PD가 10년째 제작 중인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클럽>(최다은 PD, 김혜리 씨네21기자, 임수정 배우 공동 진행)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넘게 <소년의 시간>을 다루며 10대들의 젠더 갈등과 미디어 소비 이슈라는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특히 여러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인 여성과, 나아가 남성이 일상 속에서 겪는 고민까지 이끌어내며 공론의 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최 PD의 속내를 들어봤다.
-<소년의 시간>을 필름클럽에서 소개한 이유와 <소년의 시간>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
필름클럽은 영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개봉 영화 위주로 하는데, 개봉 일정 좀 안 맞으면 가끔씩 OTT 작품을 소개한다. 당시 <소년의 시간>이 알음알음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 번 얘기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다.
10대의 젠더 갈등과, 10대와 미디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맙게도 이 문제를 거의 최초이자 그것도 훌륭한 방식으로 다룬 <소년의 시간>이란 작품이 나왔던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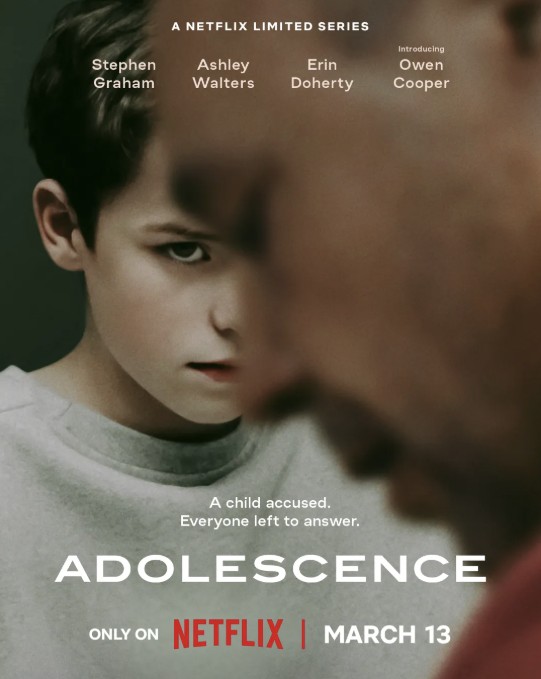
-2회에 걸쳐 <소년의 시간>을 소개했다. 그런데 다음 편에서 청취자들의 의견과 사연을 소개하면서 더 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가장 견지한 점은 “청취자 글을 비난한다거나 ‘우리 편 들어 주세요’라는 태도는 절대 갖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로 치우침 없이 사연을 소개”하자는 거였다. 우리는 사연을 꺼내 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역시나 뒤이어 의견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다음 회차까지 또 수십 통의 사연 메일이 왔다. 다른 팟케스트에서 “<소년의 시간>과 관련해 <필름클럽>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 회차에 나오는 사연까지 들어보셔라, 거기까지가 프로그램의 완성이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갑론을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다. 2000년대 출생해 일베와 강남역 살인사건, 딥페이크를 거치며 어떤 감정과 자세로 살아 왔는지 써준 여성도 있었고, 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치는 40대 남성은 남자의 관점에서 바라온 <소년의 시간>에 대한 비평은 물론 학생들에게 젠더 혐오적인 내용이 들어간 작품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된 사연은 청소년 두 아이를 키운다는 엄마의 사연이었다. 사연은 “남자 아이들도 힘들고, <필름클럽>이 <소년의 시간>을 오도했으며, 여성주의적 관점으로만 작품을 보는 게 프로파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PD와 김 기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포함된 내용인데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분은 뜨내기 청취자가 아니다. 10년 전, <FM Zine> 라디오 프로그램 때에도 사연을 보냈던 분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우리 프로그램이 ‘여성주의적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필름클럽>을 듣는 청취자도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 뭐 다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식 지향적이며, 환경을 생각할 거란 식으로 단일하게 그룹핑 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엄마 사연자처럼) <필름클럽> 청취자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같은 여성이라도 자기가 겪어온 세월이나 경험이 다르면 그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 딸을 키우는 사람과 아들을 키우는 사람,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을 경험한 여성과 6~70년대에 자라온 여성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꺼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좀 불편하지만 더 끄집어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의 시간>은 서구권에서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국내에서 시청 시간이 적었다. 왜 그런 거라고 보는가?
<소년의 시간>에 나오는 문제 의식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잘 알고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핸드폰 안에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세상을 배우는 지 부모는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예전에는 남성성을 부자 관계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청소년은 남성성에 대해 배우는 경로 등이 부실하다. 게다가 인스타그램 같은 인터넷 세계 안에 있는 매노스피어(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남성들로부터 남성성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야 말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IT가 엄청 발달했잖은가. 그런데 워낙 거대한 문제다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를 몰라 약간 외면해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필름클럽은 여성 서사와 관련한 작품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일부러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한 거는 아니다. 다만 진행자 세 명이 모두 여자고, 시각이 다 비슷하다보니 여성 서사를 다룬 작품을 많이 소개하긴 했다. 김혜리 기자님의 표현을 빌리면 양복 입은 남자들이 포스터에 떼로 나오는 ‘암청색 영화’는 저희가 아니어도 다루는 데가 많지 않은가. 그러다보니 다양성을 추구한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진행자 구성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 서사 작품들을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비중 있게 다뤘던 게 사실인 거 같다.

-한국 사회가 젠더 갈등이 심하다보니, 특정성별만 중점적으로 다뤄도 비논리적인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주의 작품을 다룰 때면 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는가?
여성 의제를 다룬 작품은 오히려 조심할 게 없다. 왜냐면 저희가 경험한 것이고 저희한테는 너무나 해석하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거나 여성을 편드는 것처럼 오독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단순히 “저 작품에 여자가 왜 하나도 안 나와?”식의 인상비평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어떤 성별이든 누가 듣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